미국 현지에서 사회복지사 강경희가 전하는 장애인의 직업재활상담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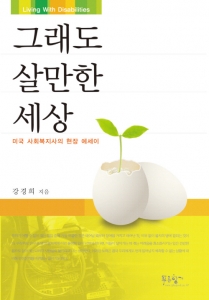
20년 가까이 미국 현지에서 직업재활카운슬러로 활동해온 강경희 씨가 상담사례들을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소아마비 장애를 가졌지만 의사의 길을 훌륭히 걷고 있는 동생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장애우의 사회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 저자는 이화여대 졸업 후 미국으로 건너가 복지학과 재활 카운슬링을 공부했다.
그동안 정신재활 클리닉, 마약 재활센터, 상담센터에서 일했으며, 현재 플로리다 주 정부소속 직업재활 카운슬러로 일하고 있는 그는 이 책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객관적이고도 평등한 시선으로 전하고 있다.
아파트에 휠체어램프를 설치하도록 요구한 88세의 메리 할머니, 여자 친구를 갖고 싶은 정신지체 청년, 미용사가 되고 싶은 성전환 에이즈 환자의 꿈 등 직접적 사례를 통해 저자는 노년에 신체적 불편을 겪어야 하는 것처럼 장애란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삶이 지닌 문제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신장애, 신체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기
저자는 서문을 통해 ‘장애가 아주 심해 자신을 돌보는 일도 하기 벅찬 사람들이 정부에서 주는 현금혜택이나 받으며 살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은 이들이 할 수만 있다면 자신에게 남아 있는 능력을 사용하여 사회라는 큰 시스템의 작은 부분이라도 되고 싶어 한다’고 전한다.
직업이 자존감과 소속감은 물론 계속 살아갈 희망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물질적 도움이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직업교육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직종의 일을 잘 해낼 수 있는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일반인들과 차별 없이 대우받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정당한 권리이며 당연한 배려인지, 또한 장애인의 가족들이 평생 견뎌야 하는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누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살 만한 세상’은 제도적으로도 발전해야 할 여지가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 사회 관계기관, 그들을 고용해야 하는 기업에서도 새로운 시각으로 장애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
